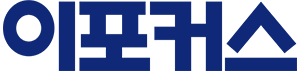- 입력 2020.12.10 09:44
- 수정 2020.12.10 11:19
![[이포커스=안성찬 기자]](https://cdn.e-focus.co.kr/news/photo/202012/2637333_1.jpg)
최근 LG전자의 플래그십 휴대폰 V50이 출시 1년여 만에 A/S가 불가능해졌다는 기사가 나갔다.
적잖은 소비자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로 LG전자를 성토했다. 일부는 "LG가 삼성에 뒤처지는 이유"라며 비아냥도 해댔다. LG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때문이라는 짧막한 해명이 전부였다. 이 해명은 그러나 설득력이 없다.
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스마트폰 부품을 4년간 보유해야 한다. 부품이 없을 경우 수리비 제외 후 부품을 교환하거나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
LG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 같은 기준을 모를리는 만무하다. 추측컨대 V50이 제대로 팔리지가 않다 보니 조기에 단종하고 부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. 그렇더라도 팔려 나간 제품에 대한 사후 책임 정도는 져야하는 건 당연한 상도의가 아닌가. 한마디로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.
기자도 LG전자의 무책임과 무성의를 해당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뼈저리게(?) 체험했다.
LG전자가 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인지,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당장 A/S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기자는 LG전자 홍보실에 수차례나 문의했다.
하지만 홍보실 담당 직원들은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고 문자 카톡을 몇 차례씩 보내 봤으나 피드백은 '읽씹'이었다.
기자의 취재를 대하는 응대 방식이 이 정도인데 과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.
기자의 취재는 LG전자의 구체적 해명과 계획 등을 보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. LG전자가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.
결국 해당 기사는 LG전자 측의 해명이나 당장의 A/S 계획 등을 담지 못한 채 나갔다.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네이버 포스트에서 1만 조회를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. LG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분통이 터진 결과일 것이다.
LG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에 밀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. 글로벌 점유율이 2%에 불과하다.
LG가 휴대폰 사업을 당장 접더라도 아쉬워할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듯 싶다.